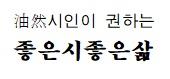

민족 대이동이라는 설날도 지나갔다. 귀성歸省이란 말이 참 낯선 말이 되어가는 듯하다. 부모를 뵙기 위해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뜻하는 이 말이 교통 사정의 혼잡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그 혼잡을 뚫고 오느니 차라리 자식들이 사는 서울로 부모가 가는 게 낫다며 역귀성 행렬이 증가하는 추세다.
역귀성은커녕 아예 설날 연휴를 몽땅 털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연휴 때마다 공항이 붐비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가족에겐 차례 같은 행사는 당연히 번거로운 구태로 여길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 시간과 경비를 들이느니, 산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낫다고 여길 터이다.
하긴 수도권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으니 귀성이란 아예 필요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터전을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형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는 곳이 곧 고향이 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마음의 고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하다. 그 고향이라는 곳이 삶의 종착점에 이르게 될 심정적 공간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고향’이 아니라, ‘내 마을’이다. 내 마을은 이미 살았던 고향이나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거처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곳-지역-공간-새로운, 마지막 터전’으로서 지향성을 가진 말이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가치 지향성을 담는다. 당연히 서정적 공간성을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말이다. 내 마을은! 이 말은 시심의 동기도 되지만, 내 삶이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숲은 창백하지 않을 만큼
는개는 지워지지 않을 만큼
집들을 가리며 드러내지
사람 또한 부르면
그립다 대답하는 산울림 간격
그래도 해는 산마루에서 떠올라
가슴 언저리에서 노을로 물들지
전원생활을 꿈꾸느냐고 힐난할지도 모르겠다.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지만 나에게는 지나친 사치가 된지 오래다. 그런 호사보다는 동녘이 밝을 무렵 그려내는 아침노을이라도 제대로 보며 살았으면 싶다. 하루치 사유의 샘물이 하늘 가득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저녁노을이 그려내는 하루치의 성찰도 마주하면 싶다.
사람을 부르면 카톡이 응답하고, 만남을 기다리면 문자가 사이를 가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야 학원이야 개인교습이야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아이들의 어미아비는 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의 첨병이 되어 있다. 아침놀이 비치기에 앞서 집을 나서야 하고, 저녁놀이 가라앉은 뒤에야 어둠의 눈을 달고 귀가한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을 부르면 그립다 메아리가 들리는 곳, 해는 산마루에서 떠오르고 지지만 언제나 그 놀빛이 내 가슴을 물들이는 곳, ‘내 마을’에서 살고지고 싶다.
혹여 길 잃은 철새무리처럼
찾지 않는 사람의 길에도
달빛은 사양하지 않고 쏟아져
슬픈 구도로 그림자를 앉히고
섣불리 내려오지 않는 별들마저
아주 쉽게 불러 안부를 묻지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고 쉽게 말하고 믿는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난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욕망의 대상과 수치가 많아지고 높아지는 형국이다. 왜 두려운가? 나의 힘이 시원치 못해서 두렵고, 이웃을 믿지 못해서 두렵고, 시간을 붙잡아둘 수 없어 두렵고, 모둠살이의 질서가 혼란스러워 두렵고, 오지 않은 미래가 오고야말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다.
사람은 본래가 슬픈 존재다. 슬프게 태어나서 슬프게 돌아가는 신세다. 그래서 두려움을 접을 수만 있다면, 욕망 또한 그 대상과 수치가 한참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자각할 수만 있다면, 슬픔도 그리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조금은 덜 채우고, 조금은 시시껄렁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새로운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면 싶다.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가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기 때문이다.
㉠머슴새도 목이 쉬어 돌아가자
무성한 이야기 들꽃으로 피어나고
㉡전설로 베를 짜느라
숲에 빈틈이 없을 무렵
㉢나의 사랑은 가을을 준비했다 했느니
서릿발 길을 밟아 찾아온다 했느니
㉣설화가 면사포처럼 무성하면
사람의 집들은 사립문을 열어둔 채
발자국 없는 눈길을 따라
먼 나들이를 준비하지 -<필자의 시「내 마을」전문>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은 우리를 봄에서 여름으로 키워내고, 여름에서 가을로 익혀낸다. 그러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밀어내고야 말 것이다. 봄이었던 날㉠들이 자라고 나면, 수많은 생존의 이야기들로 여름㉡은 숲을 이룬다. 그런 날들이 무르익고 나면 서릿발 가을길㉢을 따라 여정을 준비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사람의 집들이 사립문을 열어둔 채 설화[雪花-說話]가 만발할 무렵이면 겨울나들이㉣를 떠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어서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는 나들이길이다.
그 길이 내 마을을 중심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는 풍경, 그 정경 안에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어떻게 비집고 들어설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