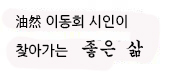

|
분신 제비가 그런다 左右之間 내 좌우명 새로 정했으니, 그런 줄 알아! 뭔데? 하나, 있을 때 잘해 둘, 곱게 늙자 셋,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반신 제비가 그런다 左顧右眄하지 않는 제비가 어디 있간, 그런 줄 몰라? 뭐라! 하나, 없을 때 잘해 둘, 늙어 곱자 셋, 노세 노세 늙어 노세, 젊을 때는 못 노나니!
전깃줄에 앉아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라 노닥거리는 제비 머리 위를 새홀리기가 꽁지깃을 활짝 펴고 활강한다
-졸시「새들의 설전」전문 |
관점觀點-viewpoint이란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보느냐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관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유는 물컵 보기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물컵이라도 남아 있는 물을 보는 사람과 빈 컵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점'은 사물이나 상태를 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남아 있는 물을 보는 사람을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거나, 컵의 빈 곳을 보는 사람을 부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고 규정하려 든다.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갈증이 몹시 심한 사람이라면 반 컵 남은 물로는 목을 축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반 컵의 물은 오히려 갈증을 부추기는 용량이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갈증은 고사하고 배가 불러서 단 한 모금의 물도 성가시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남은 물의 용량을 매우 많은 물로 보기 마련이다.
그러니 일도양단하듯 누군가의 생각의 방향이나 주장하는 입장을 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옳다-그르다, 긍정이다-부정이다, 희다-검다, 아군이다-적군이다…판단할 일은 아니다.
시의 함축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의 길은 어떻게 스스로 제 길을 내는가? 시의 표현은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한다. 시간에 쫓기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시’라는 이름으로 된 자신의 몰골을 들여다보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시에는 시심이라는 형태로 된 의도가 시적 정서로 담겼다.
세태에 대한 패러디, 고전이 주는 교훈, 그리고 생태계의 진실 등을 버무려 보았다. 남녀로 만나는 것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일이라 한다. 그 반쪽이 있어야 완전한 하나로 성립될 수 있다는 의식이 배면에 깔려 있는 발상이다. 그 반쪽을 잃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불완전한 실체일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가 있을 정도로 만남과 헤어짐이 다반사茶飯事-여반장如反掌으로 이루어지는 세태다. “있을 때 잘해야지, 헤어진 뒤에-떠나간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협박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설이 되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행하는 서양의 풍습을 패륜이라며 조롱하던 옛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있음[有-色]이나 없음[無-空]이나 모두가 결국은 똑같은 존재의 다른 현상[色卽是空-空卽是色]임은 이미 숙지하고 있을 터이다. 그럴 때 고전은 우리의 고독을 달래줄 수 있는 도피처가 될 만하다고 여겼을까.
우주 삼라만상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때 변화는 생성과 소멸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는 성장의 속성이기도 하다. 변화해야 성장할 수 있다. 몸도 맘도 그렇고, 물질도 정신도 그렇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접속할 때만이 비로소 자아는 거듭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중에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보고, 변치 않는 것을 찾으려 하며, 그 불변에 목숨을 걸려고도 한다. 무망하지만 그래서 인간이고, 그래서 사람의 삶인 모양이다. 그런 중에 ‘사랑의 질량’ ‘행복의 총량’ ‘예술의 감동’ 등은 시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려는 속성이 인간의 내면에 남아 있는 듯하다.
고전은 세월의 흐름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한 진리로 여기려 한다. 그러나 좌우의 사이[左右之間]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상을 자유롭게 논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을까? 이쪽저쪽 눈치도 보지 않고 망설임[左顧右眄] 없이 오로지 주체적 양식과 인간적 염의가 오염되지 않게 정의로운 관점을 유지하며 살았을까?
이런 자문에 부끄러운 자답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낭패다. 이럴 때, 제비들이 노닥거리는 소리[의성어]가 고전의 한 구절로 들린다고 해서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논어. 위정편] 그렇게 논쟁하고, 입씨름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다투고, 사네 못 사네 원수 삼기를 하는 동안에도 생태계는 멈추지 않는다.
제비보다 빠른 제비의 천적이 바로 ‘새홀리기’라는 맹금류다. 이 새는 제비를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며, 제비만 노리는 새다. 인간의 천적은 무엇일까, 바로 시간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도 ‘시간홀리기’가 쉬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