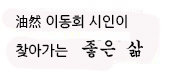

|
1월 나무에게 말을 걸자 눈꽃을 달고도 뜨겁다며 눈웃음 짓던 웃음소리 들려오네, 지난해 2월이 남기고 얼굴로
나는야 8월에 숨을 받은 여름나무 푸른 안경을 쓰고 여태 걸어왔으나 어느새 서리꽃 무성하네, 이듬해 넘보느라 늦지 않은 걸음으로
바람의 시침이 새긴 눈금마다 웃음의 잔해들 소리 없이 나부끼고 거울의 받침대를 잃은 계절의 나이테 시나브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네
졸시「표정 -겨울 산길에서」전문 |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마음속 심리와 감정의 모습이 있다. 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표정만으로 사람의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포커페이스네, 아닌 보살 때문만은 아니다. 카드게임에서 좋고 나쁨을 상대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표정을 바꾸지 않는 데서 유래한 것이 포커페이스가 아니던가. 아닌 보살도 마찬가지다. 일설에 의하면 이 말이 북한 용어라고 하지만,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닌 보살하다”라는 관용구로서,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하다”라고 뜻풀이를 해 두었다.
이 두 말은 모두가 속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수작인 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만을 보고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단[四端: 惻隱之心-羞惡之-辭讓之心-是非之心]과 칠정[七情: 喜怒哀樂愛惡欲]이 오온[五蘊: 色-몸 물질의 반응, 受-느낌 감각, 想-상상 연상, 行-행위 행동, 識-식별 판단]등과 결합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고 위장하여 드러나는 인간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난 표정만으로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심통부리는 어린아이의 속마음이나, 내공 부족한 인간들이 불평불만을 그대로 얼굴로 써내는 것쯤이야, 표정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 미묘하기만 한 성인의 속내를 얼굴에 그려진 표정만으로 읽으려다가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마치 형편없이 나쁜 패를 숨기고 아닌 보살하는 노름꾼에게 거액을 배팅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1월 겨울 산에 올랐다. 나목은 겨울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는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나약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상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단풍나무며 참빗살나무 등 낙엽수들의 가지 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들의 표정이 읽어진다. 고단한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가지마다 뭔가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듯하다. 놀랍다. 모처럼 며칠 계속되는 영하의 기온에도 잔뜩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에 비해 나무들의 표정이 의연하다. 어디에서 저런 기운이 솟아나는 것일까?
하긴 자연은 ‘천장지구’하다.[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耶. 故能成其私: 하늘과 땅은 영원무궁하다.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장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자신을 남보다 뒤로 돌림으로써 남보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무사(無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노자『도덕경』제7장)] 하늘만큼 길고 땅만큼 오래된 것을 일러 우리는 자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지는 자연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오래 되었다’도 가능하지만, ‘오래 간다’도 가능하다.
자연의 표정을 인간이 육안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항상 변하다-無常하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거두고 마음의 눈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항상 그대로다-불변하다-영원하다.’ 인간이 유한 함에 비해서 자연은 영원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 내년의 봄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연의 표정인 나무를 보면 안다. 나무는 겨울에도 생명을 안으로 다독이고 있을 뿐,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표정을 달리할 뿐이다. 혹한 속에서도 새움을 준비하는 생명의 태동을 보여준다.
말라비틀어진 겨울 나무에게 다가서서 말을 걸어본다. 그 왕성하던 잎들은 어디에 두고 이리 홀로 쓸쓸한 것이냐고 말을 건넨다. 작년에 보았던 눈꽃을 달고도 생명의 태동을 보여줬던 나무의 표정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 나무의 태동은 인간에게는 없는 달콤한 웃음이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키우는 자연의 힘을 본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인간은 한창 무성한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늦가을이다. 청춘의 희망역도 지나왔고, 장년이 성취한 보람도 거둬봤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어느새 여름나무였던 화자의 몸은 “서리꽃이 무성하다.” 넘겨다보지 않으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자연은 겨울 속에서 봄을 잉태하고 있지만, 인간은 가을 속에서 겨울을 맞이할 뿐이다. 지난해가 아니라, 이듬해를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재촉할 뿐이다.
시간은 바람과 같다. 바람의 실체는 바람 아닌 것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깃발이 나부끼는 것, 머리칼이 휘날리는 것… 등을 통해서 바람을 실감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실체가 있는 시간을 확인할 길은 시간이 아닌 것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얼굴에 깊게 파인 골짜기는 시간이 만든 고뇌의 흔적이다. 사람의 몸이 점점 가을 무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시드는 풀잎처럼 허물어지는 것, 이것 역시 시간의 발자취다. 시간은 자신의 몸은 감추면서 그 흔적만은 뚜렷이 남긴다.
그래서 시간의 받침대를 만들고자 한다, 인간은! 거울[自省]이 비친 얼굴 표정은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안간힘이다. 나이에 걸맞은 얼굴이 아니라, 자연을 닮고 싶은 간절함으로 자신의 표정을 읽는다. 그럴 뿐, 어느 시대 어느 인간도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했다. 거울[省察]로 세운 시간의 받침대마저 끝내는 무너지고 말 것이므로! 그런 눈길로 끝나는 날까지 자연의 표정을 읽으려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