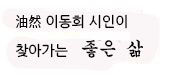

|
쌀밥 뜸 들이려 졸리는 새벽부터 백팔 배로 군불 뗀 일 뜀박질에 가속 페달 밟아 청춘부터 여기까지 산을 오른 일 부실한 근력은 놔두고 국민보건체조로 정신을 개조시켜 온 일 자투리 밭 사과를 익히려 가을날 마지막 햇볕까지 치근댄 일
사랑이라며 사랑한다며 사랑하겠노라며 통키타를 퉁긴 일, 말고 단 한 일도 맑은 날 없으니
비로소 저작하는 일이 저작하는 날보다 갠 날이어서 물든 나를 지우다 쓰다 지우는 나날
-졸시「오염된 시간」전문 |
심리학적으로 ‘오염된 시간’은 본질적 자아와 동떨어진 시간이다. 그 시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나, 내가 오류를 저지른 시간들이다, 나아가서 그 시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그 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거나, 내가 원했으나 그 원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훼손시킨 시간들이다. 그러고 보면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들, 한 일들이 얼마나 될까?
생존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단 하루도 뒤주에 쌀 긁는 소리가 날까봐 두렵지 않은 날들이 있었을까? 그런 먹을거리를 습득하기 위한 일들 아닌 일들에 살고 싶은 바람을 허영이네, 현실감각 없네 하며 질책 당하곤 하였다. 그런 행위는 필연적으로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다. 그런 굴복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다.
올라가는 길만이 가치인 줄 알았다. 아니 남들의 지향점이 정상이라면 나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줄기차게 등산을 했다. 그 높이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그 높이에 오르면 과연 세계를 드넓게 조망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무작정 오르는 일이 미덕이요 가치이며 소명인 줄 알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 나의 좌우명이 되려했다. 청춘을 그렇게 노심과 초사에 매달리며 산 시간들이 있었다니,
‘육체노동의 신성함’이라고 쓰고 보니 내가 참 염치가 없다. 내 근력은 도무지 그 힘든 노동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 부실한 근력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국민정신 개조운동이었다. 학교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나의 ‘남다름’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닮음’으로 세뇌시키는 일이었음을 아프게 되새기게 되었다. 생각 없는 집단 속의 평안을 택할 것인가, 생각하는 개인의 우울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나는 언제나 전자의 불안으로 나를 자발적으로 소외시키곤 해왔다.
밥그릇의 크기를 늘리려 하지 말고, 밥그릇에 담기는 품질을 따지는 일-날들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실한 내 영토에서 가꿔지는 과일나무는 언제나 나를 사과하는 데 익숙하게 길들여 왔다. 해바라기 인생의 비극이다. 햇빛이 없으면 햇빛을 찾아서 햇빛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날 줄을 모르고, 해가 나기를 기다리는 해바라기의 타성으로 나를 길들여 왔다.
그래도 그런 일 날들 중에도 사랑노래를 부르는 일 날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안다. 속셈으로 사랑을 계산하지 않고, 타령조로 사랑을 희롱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그랬을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이다. 사랑이 거리감을 둔 떨림에서 비롯하지만, 그 거리가 좁혀진 뒤의 사랑노래는 기타의 현들이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는 떨림의 직접성 아닌 사랑 없다. 사랑일 때,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갠 일 날들 속에 나를 허물 수 있는 것.
어찌하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저작은 ‘咀嚼저작’이다. 음식을 입안에 넣고 씹는 행위를 저작이라고 한다. 두 한자 모두 ‘(음식물을)씹다, 씹어서 맛을 보다’라는 뜻을 지녔다. 때가 되면 용케도 음식을 씹으려는 욕구가 발생한다. 끼니를 거르거나, 깜박 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어찌 그렇게도 씹을 때를 잊지 않는지 용한 일이다.
저작은 씹을 것[음식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간은 원시시대 이래로 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일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다. 크고 작은 나라 간의 전쟁이나, 제 나라 겨레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내전이나, 농촌에서 제 논에 물 대려고 물꼬 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알고 보면 이 씹을 것[먹을거리]을 빼앗으려 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 아닌 것이 없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극악한 싸움의 진상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뿌리가 ‘著作저작’에 힘을 쓰는 쪽으로 내달린다. 거창하게 인문학적 필적하는 업적을 남기려는 과욕만은 아니다. 그저 咀嚼에만 매달리다 한평생을 마감하는 노릇이 조금은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다,
기초욕구인-‘먹고사니즘-['먹고 살다'와 이념, 철학 등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ism'의 합성어.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조어로 생계유지에 급급하거나 몰두해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태도를 의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됨됨이의 한계를 조금은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박하거나, 철없는 소망의 반영일 것이다.
著作이나 咀嚼이나 우리말 소리는 저작이다. 시가 지닌 전가의 보도를 빌려서 애매하게 내 시에 앉혔다. 다만 앞이 著作이고, 뒤가 咀嚼으로 읽으면 조금은 쉽게 의미와 느낌에 닿을 것이다. 저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마음가짐에 이르렀구나! 잔뜩 오염된 시간의 탁수를 빼내려고 지금까지 늙어왔구나! 안도감으로 나를 지우듯이 쓰고, 쓰듯이 지우는 나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