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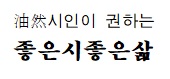
|
밥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 것 눈물로 만든 밥보다 모래로 만든 밥을 먼저 먹을 것
무엇보다도 전시된 밥은 먹지 말 것 먹더라도 혼자 먹을 것 아니면 차라리 굶을 것 굶어서 가벼워질 것
때때로 바람 부는 날이면 풀잎을 햇살에 비벼 먹을 것 그래도 배가 고프면 입을 없앨 것
-정호승(1950~. 경남 하동)「밥 먹는 법」전문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허물을 저지른 사람의 내력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생존-생계’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으레 ‘먹고’가 앞에 붙곤 한다. 하긴 먹지 않고 사는 유기체는 없으니, ‘먹고 산다’는 말은 유기체의 특성임과 동시에, ‘살아있음[삶]의’ 전제 조건이 ‘먹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놈의 목구멍[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문제지!”라는 구차함 대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터이다.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두루 쓰인다. 저잣거리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으며, 고귀하고 존엄하다는 법정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저지른 과오는 크지만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또한 처지나 상황이 매우 절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이나 혹은 가벼운 형을 언도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때 가장 많이 참작되는 정상이 아마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또한 “사흘 굶어 담장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다. 이 말도 곰곰 따져 보면 앞에서 인용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격언과 그리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굶주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심도 정의도, 도덕 윤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시시콜콜 따질 겨를이 없을 만큼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흘이 아니라 며칠을 굶어도 담장을 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자진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1세기를 맞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롭게 물질을 소비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 용기는 왜 가지지 못하는가?’라고 질책만 할 일이 아니다.
남의 집 담장이라도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 강력한 심장, 철판을 깐 면상, 거짓말을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달변의 혀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폐문하고 ‘월세를 미뤄서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혹은 ‘남은 반찬이 있으면 좀 나눠 달라’는 미안한 메모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긴 있다.
그래서 ‘먹고 살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의 체험과 말의 질량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유기체의 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정신의 지향점을 암시 받는 것도 같다. ‘눈물’에 빵을 찍어 먹건, 밥을 말아 먹건 그런 행위와 ‘인생론’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박한 처지에서 먹는 밥은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훈장의 헛기침이 좀 사치스럽지 않은가? 아마도 <눈물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생크림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전제로 들리기도 한다. 하긴 이를 발설한 빅토르 위고도 ‘개뿔도 모르면서 인생을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투로 던진 말이었을 터이다.
그래서 자문한다. 나는 ‘밥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가? 섣불리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젊었다. 그래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나의 청춘은 빛이 바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고백했다. ‘함부로 명패를 달지 않았을 뿐/ 빛바랜 청춘에게도 영혼은 푸르다“(졸시「정박」에서)라고. 그렇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눈물로 만든 밥이건, 모래로 만든 밥이건 나의 청춘은 늘 허기졌다. ‘전시된 밥’을 먹지 않으려 애쓴 적도 있긴 있었다. ‘자발적 소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할 때의 지적 호기심이 그랬다. 그러나 차라리 ‘굶어서 가벼워질’ 때까지 먹는 것을 금하진 못했다. ‘바람 부는 날이면/ 풀잎을 햇살에 비벼 먹으려’고 시-문학을 택하기도 했다.
낭만을 장식품처럼 입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본능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를 몰아갔던 것 같다. 그래도 끝내 ‘입을 없앨’ 용기는 없었다. 모든 먹는 것이 ‘입’으로만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입만 없애면 먹는 것 때문에 ‘자존’이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먹는 것’을 ‘사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였기 때문이다. 바로 평안한 노을이 붉게 타오른다고 믿을 무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