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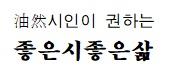
|
4월과 5월 사이 深夜, 深山은 전쟁 중이다 딱따구리가 총부리를 꼬나들고 나무의 등뼈를 향해 따따따따아따따 따따따따아따, 양철지붕에 우박 퍼붓듯 총알을 퍼붓고 있다
―그리하여, 시퍼렇게 실신한 산의 사타리로 젖무덤으로 진군하는 등 푸른 저 도마뱀 군단들!
-김춘추(1944~ 경남 남해)「신록에 관하여」전문 |
깊어가는 가을이다. 겨울이 숨긴 자락들이 아침저녁으로 날카로운 비수를 드러내려 한다. 이럴 때 신록 이야기는 절후에 맞지 않는지도 모른다.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기가 무색해지는 21세기다. 겨울에 여름 이야기를 불러오고, 가을에 봄 이야기를 불러오는 게 전혀 무색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러기를 선호하는 게 세태다.
아이스크림의 판매고가 겨울이라고 달라지지 않으며, 냉방기가 온풍기 역할까지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로동선夏爐冬扇-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는 물건의 쓸모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용지물을 상징한다.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나 쓸모가 하로동선 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물질을 떠나 정신으로 하로동선을 접목해 보면 깊은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정신작용의 용처는 하로동선이어야 한다. 당장의 쓸모만, 눈앞의 이익만, 이기적 계산만 앞서는 존재라면, 관계라면 그것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비록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을지라도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사람을 기르는 것은 이익을 투자하는 것과는 격을 같이 하지 않는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지금의 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넘치는 게 쓰레기이며, 남아도는 게 사람인지도 모른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의미는 달라진다. 지금은 북풍한설이 매섭지만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여 부채를 갈무리해 두는 염력念力, 지금은 염소 뿔을 녹이는 무더위지만 겨울을 생각하여 난로에 기름칠을 해 두는 여력餘力, 이 힘들은 사려 깊은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런 쓸모의 범주를 벗어나 나[自我]에 초점을 맞춰도 마찬가지다. 겸손과 겸허함, 한없이 낮아지고 비워내는 주체적 인간성으로 나를 볼 때 거둘 수 있는 생각이 하로동선이다. 나라는 됨됨이는 여름의 난로며 겨울의 부채라는 자각. 이 생각의 뿌리는 도가와 불가의 핵심과 닿아 있을 때 가능하다. 유무상생有無相生-제법무아諸法無我가 그것이다. 여름에 눈에 띄지 않는 난로를 잊지 않는 것, 겨울에 부채를 기억해 두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낳게 한다. 삼라만상이 모두 본체로서의 제 모습이 어디에도 없는데, 하물며 기껏 백년을 사는 ‘나’의 실체가 무엇이겠는가!
4월과 5월 사이는 신록이 무성해지는 시기다. 이때를 맞추어 딱따구리도 제 삶을 챙긴다. 깊은 숲마다 딱따구리의 집짓는 소리로 요란하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딱따구리가 살아가는 소리를 다르게 듣․보려 한다. 굳이 ‘동시-동심’이 아니라도 모든 사물은 보는 사람 마음이다. 여름에는 부채만 보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는 난로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보려 하지 않는다. 시인이 가장 닮고 싶은 존재-어린이도 그렇게 보려 하지 않는다. 부채가 보이면 난로를 생각하고, 난로가 보이면 부채를 떠올린다. 즉 눈에 띄는 대로 보이지 않고 제 마음 속에 간직한 마음[시심-동심]으로 보려한다.
그렇게 봤을 때 아연, 사물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며 특별해지는 줄을 알기 때문이리라. 시 읽기에 서툰 사람들은 그러리라. 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사물은 과연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게 진실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리라. 신록으로 나날이 짙어가는 숲을 바라보며, 그 말문이 막히도록 짙푸른 5월의 신록을 바라보는 눈길의 경이로움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크다.
‘ 말문이 막히도록’ 짙어가는 신록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본 이 라면 시인의 발상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이 깊은 사람은 ‘깊은 밤-깊은 산’을 선호한다. 딱따구리도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심야 심산을 골라 생각의 집을 짓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하필이면 총부리인가? 딱따구리의 집짓는 소리가 그렇다. 총질은 생명을 거스르는 반동의 짓이요, 총소리는 목숨을 거두려는 반역의 소리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가?
시의 어법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술은 바로 반어와 역설이다. 시인마다 지니고 있는 사유와 미감의 총부리에 이 탄알을 장전하지 않고서는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 없다. 이때 적은 말할 것도 없이 시정신의 승화를 비유한 반어다.
딱따구리의 총질에 대책 없이 쓰러지는 적은 다름 아닌 ‘등 푸른 도마뱀 군단들’이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실신한 산의 사타리[사타구니]와 젖무덤으로 쏟아져 밀려들어온다 하지 않는가. 오월 신록의 숲을 찾아 할 말을 잊고 신록을 우러러봤을 이런 반어와 역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신록, 그 무성함을 어떻게 드러낸단 말인가! 그래서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유무상생이요 제법무아의 세계를 그려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