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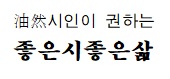
“마지막, 사랑도 미움도 평안히”
|
뒷산을 오르다 동그란 무덤 잔디 위에 누워보았네.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더 없이 편안해 보였는데
무덤 앞에는 비석조차 없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알 길도 없이
새 소리만 들리는 것이 더 더욱 맘에 들었네
-서홍관(1958~ 전북 완주)「무덤」전문 |
이 시를 읽으며 내 심금을 울린 구절은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더 없이 편안해 보였는데”였다. 그것 말고는 이 시에서 별다른 특징도 의미심장한 경구도, 그렇대서 무릎을 칠만큼 탁월한 미학적 기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나의 심금에 있는 가장 낮은 현을 계속 튕겨 주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그냥 넘겼다가 다시 돌아와 읽어보기도 하고, 스크랩한 시 공책을 하릴없이 이리저리 넘겨보다가 결국은 이 시가 담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낳은 시인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현직 의사라는 구절이 또 한 번 나를 붙잡았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을 돌보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직업이 아니던가? 그런 분의 안목에서 터져 나온 예의 그 한 구절,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더 없이 편안해 보였는데”라는 일성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들릴 법하였다.
‘그래,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의 끝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각성을 통해서 나를 응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나의 생명은 어떤가? 나 역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고 절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편안해하며 희망을 느껴야 하는가? 자문해보니 자답은 후자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절망으로 해석하려 한다. 특히 시와 같은 사색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인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마저 기꺼이 시적 사색-시심에 내어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임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이 시를 읽기 전날 필자가 겪은 에피소드가 이 시를 읽는데, 이 구절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 시절 필자는 초등학교 교편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40년 전에 졸업시킨 제자들이 ‘은사 찾아뵙기 행사’라며 나를 저들의 송년잔치자리에 불렀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십대의 코흘리개들이 50대를 넘긴 장년이 되어 나를 환영해 주었다.
그런 중에서도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불사조 같은]한국의 아줌마’가 다 된 녀석이 그런다. “선생님은 벌써 호호백발에 꼬부랑할아버지가 다 되었으리라 짐작했는데, 이렇게 젊은 오빠로 나타나셨느냐!”고 지청구 아닌 반가움을 표하며 나를 와락 끌어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엉겁결에 “그래 겉은 이렇지만 속은 이미 곰삭아버렸다.”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와 곰곰 생각해보니 저들이 나의 마지막을 그렇게 점치고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내 삶의 연치가 벌써 그렇게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짐작케 하는 지적이었음을 느꼈다. 그런 다음 드는 생각이 ‘그래, 너희들처럼 반세기 가까운 시간의 터울을 지나서도 찾아주는 인연이 있다니, 얼마나 편안한 인생이냐!’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하여 도달한 ‘마지막’ 집이 바로 ‘둥그런 무덤’이 아닌가. 우리네 마지막 집은 둥그런 잔디를 지붕으로 이고 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몸을 담았던 집-초가지붕 역시 둥그런 볏짚-풀잎으로 되어 있었다. 지붕이 둥그런 초가지붕에서 살다가 ‘마지막’을 거쳐 다시 둥그런 잔디지붕에서 영원을 잠드는 모습이다. 살아 있을 때나, 살아 있지 못할 때나 집은 둥그런 평안 모드다.
이런 집에서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알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살아서나, 살아 있지 않아서나 사랑과 미움은 앎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스쳐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거나, 잠시 흔들다 떠나는 바람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그런 중에도 “새소리만 들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다. 사랑에 속고, 미움에 안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사랑에 기뻐하고 미움에 아파해야 할 틈[시간]이 없다. 사랑을 사서하고, 미움을 지어서 하는 동안 ‘마지막’은 가차 없이 새소리만을 동반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던가. ‘잔디 위에 누워’ 바라보니 비로소 그 마지막이 보이는 것이다.
아~ 나도 그렇게 사랑에 속았다 여길 때면, 미움에 아프다 느낄 때면, 조용히 동그란 무덤 잔디 위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평안히 듣보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