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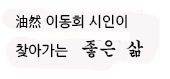
|
쇠붙이로 너를 열려던 아침, 새들의 방문—
너를 잠갔던 녹색 언약처럼 멈추지 않는 건 시간과 선율뿐이라는데
계절을 갖춘 입성으로 자라서 나를 입히려는지 푸른 노래를 지저귀는구나
-졸시「푸성귀 -내 서정의 기울기・5」전문 |
3월 첫날에 채소모종을 선물 받았다. 도시살이에 무슨 밭뙈기나마 있을까마는, 서둘러 꽤 큼지막한 플라스틱 포트 두 개를 구입했다. 그리고 상토 몇 포대로 화분을 채우고 예의 채소 모종을 심었다. 심을 때 보니 아직 여리기가 녹색 쉼표 같은 저 이파리들이, 병아리 주둥이 닮은 저 줄기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채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교차 큰 온도를 견디기 용이한 베란다 햇볕 바른 곳에 안치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중요한 일과가 생겼다. 아침이건 낮이건, 오후건 밤이건 틈만 나면 베란다 채소 포트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되었다. 때맞춰 물 주기는 기본이요, 채소밭에 주면 좋다는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뿌려 주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귀동냥을 들어서가 아니다. 저 여린 생명들이 자라날 모습들이 궁금해서다. 도시 변두리 옹색하기 그지없는 반지하 신세 포트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다.
꽤 큰 사각 포트에 옮겨 심은 쌈 채소 모종들은 다양했다. 쌈케일, 뉴그린, 적잎치커리, 다채, 치마상추, 볶은머리 닮은 상추, 장다리, 청경채 등 모종들이 두세 포기씩 자리를 잡았다. 이름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구글에 물어봤다. 친절하게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어찌 이리도 다종다양한 채소들의 씨앗을 구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채소 모종을 전해준 그분들의 심결이 채소들이 자라는 속도와 채소들의 손과 얼굴이 자라는 넓이에 비례해서 궁금해졌다.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하다.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후반부를 고향 가까운 농촌에서 살겠다며 귀촌한 부부들이 심신의 노고를 기울인 성과물이리라. 부부는 새로 장만한 시골집 앞 담장을 허무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앞뜰에는 온갖 꽃들을 가꾸며 시골 동네를 꽃동네로 만들어 갔다. 이는 부인 몫이었다. 뒤꼍 채마밭에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채소 모종이며 꽃모종을 가꾸었다고 했다. 이는 남편 몫이었다. 부부가 일군 시골집은 그러므로 인생 2모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인 셈이다.
꽃밭을 가꾸고 채소를 기르는 몸의 노작과 함께 정신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일에도 부지런했다. 각종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생활에 미학적 즐거움을 배가시켜 나갔다. 그중에서도 시 창작반에 부부가 함께 나란히 참여하여 의욕적으로 습작 활동을 했다. 문학소년-소녀의 잠재적 소질이 발휘되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시가, 문학이, 예술이 생활과 따로 떨어져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생 후반부에 찾은 실천적 삶이 생생한 창작의 소재들이 되어갔다.
이런 분들이 보내준 모종들이서 그런지 채소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랐다. 정확히 2주 만에 첫 번째 수확을 했다. 채소 아래에 붙은 잎들을 따서 모으니 한 끼 쌈으로 충분했다. 모종을 심은 지 30일이 지났다. 봄 가뭄으로 농촌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지만, 도시 베란다에 햇볕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쨍쨍 비쳤다. 그 덕분인지 채소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정확히 한 달 만에 서너 번 채소 잎을 따서 식용으로 삼았다. 우리도 두 늙은이만 사는 처지라 몇 잎만 있어도 충분했다. 채소들이 자라는 속도가 우리가 채소를 필요로 하는 시기보다 앞서 무럭무럭 자랐다.
싱싱한 쌈 채소를 먹는 즐거움은 식감에만 있지 않았다. 구입한 채소들이 농약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걱정을 아예 하지 않아도 좋을 안도감, 필요하면 가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잘 자란 채소 중 몇 잎만 따도 되는 현장감, 채소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직접 따서 먹게 되는 신선한 식감, 무엇보다 내 손으로 물주고, 거름 주고, 가꾼 노작의 소출물이라는 성취감 등, 채소를 섭취하는 식사 시간이 사유를 깊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중에도 파릇한 채소들이 주는 생명감이었다. 플라스틱 포트의 싱싱한 넉넉함이면 드넓은 채마밭 부럽지 않았다. 일용할 식품이라면 더 있어 무에 쓸 것인가. 그저 2,3일에 한 번씩 쌈을 먹거나, 천연 비타민을 섭취할 정도라면 화분 텃밭으로도 충분하다. 채소는 식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쌓아두고 먹을 수도 없는 식품이다. 그러자니 ‘푸성귀’라는 말이 귀하게 여겨졌다. 나물이나, 남새나, 채소, 야채 등이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푸성귀라는 말처럼 정겹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아침에 가위를 들고 샐러드에 넣을 푸성귀 몇 잎을 따러 베란다로 나가니,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귄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려는 건지, 이 푸른 이파리를 저들에게도 좀 나눠달라는 건지, 그도 아니면 푸성귀만 귀히 여기지 말고 저들 노래도 들어달라는 건지, 요란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명에 의지하여 목숨을 연명한다. 생명의 원동력은 녹색에서 온다. 푸성귀가 주는 싱싱함이나, 새들이 부르는 노래나, 우리가 거리낌 없이 삶의 순간을 즐겨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들[자연]과의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멈추지 않는 시간을 노래하는 선율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