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좋은 삶 시상수상詩想隨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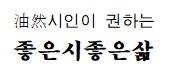
아침놀이건 저녁놀이건 해님은 노을을 만든다.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웅장하게 채색된 하늘이 무량한 사유의 노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 하늘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런데 노을은 저녁놀만 노을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 그리고 노을은 으레 황혼으로 직역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한 황혼은 인생 다된 노년-말년으로 끌어다 붙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가 다 가고 나면 서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황혼을 그려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겨우 하루치 시간으로 육십 평생, 백년행락 인생을 견줄 수 있으려면 대단한 압축-축약된 인생이라야 할 것이다.
저녁놀은 하루치 해가 지면서 남기는 하늘그림이라면, 아침놀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하루치 해의 전조인 셈이다. 니체가 580개의 잠언 형식으로 집필한『아침놀』은 그러므로 인생의 앞길에 대한 예시요 예언일 수 있겠다. 검은 하늘을 뚫고 비치는 아침놀은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의 어둠을 벗겨내고 마주하는 지혜의 서광이어야 할 것이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니체) 아침놀을 맞이하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늘그림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설령 그 누군가가 특정한 뉘가 아닐지라도 시대의 어둠에 휩싸여 있는 우리 시대의 불운에 대한 위로였으면 또한 어쩔 것인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기쁨의 선물이 생각이라면, 그 선물에 정작 위로받는 사람은 생각의 주인, 그 자신일 것인가?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니체) 저녁놀을 보면서 하루치 생명 양식이 다 했음이 아니라, 하루치 생명 작용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들이었다는 자각, 그것들이 황혼을 딛고 내일 밝아올 아침놀을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의 노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죽지만 않는 일이라면, 나를 죽이지만 않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단서 앞에서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인가?
아침놀이 무지의 어둠을 벗겨내는 서광이라면, 저녁놀은 하루치 생명작용에 대한 마무리 그림이다. 입춘을 맞으면서 추워서 더 길었던 겨울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기운을 느낀다. 대보름날을 맞아 설날도 벌써 이렇게 기울었음을 새삼 돌아보며 무력하게 시간에 기댄 생활이 나를 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떠밀려 가는 듯한 속도감에 당황해 할 것인가?
해님은 저물면서 노을꽃을 피운다
주황웃음 지우느라 온몸을 기울여 작업하는
하늘을 보라
슬픔이 짙어야 밤은 온다
통곡을 침묵 속에 묻어둔 이여
하룻밤 지새듯,
그렇게 소리 없이 별꽃을 피우노라면
온전한 밤마다 슬픔 또한
흐르는 빛이 되리니
아침, 노을꽃이 되리니
-<필자의 시「위로」전문>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인가? 미사일이 마치 컴퓨터 게임 하듯이 민간인이 사는 공동주택을 무너뜨린다. 별안간 터진 포탄에 집을 잃고, 엄마 아빠를 잃고, 산 사람과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데 나뒹구는 참상을 지켜보는 전쟁 난민들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달래줄 수 있을까? 그저 막막한 심정이다. 더 막막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방 남북이 형제처럼 잘 지낼 것 같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들뜨기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 나날이 되었다. 선제공격이니, 무자비한 응전이니, 남의 나라 참상을 보고서도 그 참상을 이 땅에 다시 불러오고 싶어 안달하는 형국이다.
이태원인가 하는 곳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한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추모제를 지냈다고 한다. 주로 젊은이들이 희생자들이었고, 아들딸을 떠나보낼 수 없는 부모들의 애통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이 눈물을 삼켰다고 한다. 대명천지라고 한다. 21세기 문명화된 세계라고 한다. 전쟁도 길거리 참상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명의 실상이 이런 것이어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
남의 나라 전쟁이건, 우리나라 참상이건 나를 죽이지 않았으므로 나를 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말을 잃는다. 나를 강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전쟁을 무슨 불꽃놀이쯤으로 여기는 망념만은 거두었으면 한다. 하루만이라도 온 국민을 평안하게 하기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발상의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문명이 꽃으로 노래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문명국이고, 그래야 인간다운 사회다.
슬퍼하는 이를 달래는 길은 함께 슬퍼하는 길뿐이다. 별의 벗은 어둠이듯이, 기쁨에 달뜬 이를 진정시키려면 역시 함께 즐거워하는 길뿐이다. 아침놀이건 저녁놀이건 모두가 해님의 동반이듯이. 그래서 그런다. 남을 위로하려는 마음의 지향하는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뒤안길이다. 침묵 속에서 속울음 깊은 시대의 불운에 이렇게 ‘위로’를 보낸다. 나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가난한 시심을 위하여.
아플 때는 그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슬플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 아무리 슬퍼해야 해는 하루에 한 번만 뜨고 진다. 밤이 밤답게 어두워야 비로소 별이 빛난다. 슬픔도 제대로 슬퍼해야 슬픔이 농익어 별꽃을 피운다. 나 하나 때문에 아프거나 슬프다면 얼마든지 슬프고 아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온 누리가 어둠이듯이, 어둠에 묻히고 보면 별만이 길이요 구원이듯이, 아픔이나 슬픔도 분명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빛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