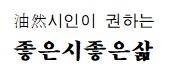

|
어느 날 아침 게으른 세수를 하고 대야의 물을 버리기 위해 담장가로 갔더니 때마침 풀섶에 앉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담장 높이만큼이나 폴짝 뛰어오르더니 거기 담쟁이덩굴에 살푼 앉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 미끄러지듯 잎 뒤에 바짝 엎드려 숨을 할딱거리는 것을 보고 그놈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감탄을 연거푸 했지만 그놈 청개구리를 제(題)하여 시조 한 수를 지어보려고 며칠을 끙끙거렸지만 끝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劫)을 두고 찬미할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조오현(1932~2018 경남 밀양)「절간 이야기」전문 |
이 작품은『절간 이야기』라는 책에 실려 있다. 무산 스님의 글은 모두가 산문인가 하고 읽다보면 시 같이 느껴지고, 시인가 하고 읽다보면 산문처럼 느껴진다. 하긴 좋은 이야기의 형식이 시면 어떻고, 산문이면 어떻겠는가? 좋은 시는 형식의 울타리를 깨뜨리며 말의 길을 [선으로]왜곡시키기를 선호하지 않던가. 그리하여 세상에 가장 처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시의 길이기도 하다.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 '염장이 이야기'를 담은 글이 있다. 4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염습하는 일에 매진해온 한 염장이를 설악 스님이 우연히 조우하고, 마치 인터뷰하듯이 담아낸 이야기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내도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면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적이 있다. 형식이 규정하는 틀에 시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품고 있는 길을 따라 말씀을 놓으면 스스로 형식이 된다. 무산 스님께서 즐겨 채택하는 시법이요, 어법이다.
그런데 이 시집의 모든 작품이 '절간 이야기'로 되어 있다. 작품의 분별이 없이 모두가 절간에서 수행하면서 목격한 스님의 안목에서 우러나온 깨침의 이야기로 들린다. 하긴 분별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 절간 이야기이지 실은 속세의 이야기로 풀어 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절간에서는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속세에서는 이야깃거리도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수행자의 안목으로 보니 더욱 더 잘 보인다는 뜻일 터이다. 세속의 눈으로 산문山門을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출가한 적이 없는 속인의 눈에 산문이 제대로 비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자는 속세를 떠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수행자의 눈에는 속세 이야기를 언제나 산문 생활의 경계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출가 자체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로지 진리를 향한 용맹정진을 자청한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출가자의 말씀은 그대로 속인들이 갖추어야 할 지침이 될 수 있다.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그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劫)을 두고 찬미할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라고. 어느 물리학자도 그랬다고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할지라도 풀잎 하나의 비밀도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은."이라고. 풀잎의 구성 성분이나, 풀잎이 생명작용을 하는 원리를 왜 밝힐 수 없겠는가? 그런 정도야 충분히 분석하고 해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할지라도 아무 것도 없는 맨땅 위에 이 세상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풀잎 하나를 돋아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학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생명작용의 신묘함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교만을 부려대는 사람의 됨됨이를 과학자는 과학의 언어로 질타했다면, 무산 스님은 개구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생명작용'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감탄과 찬미의 속내는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아우르는 품이다.
스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놈=청개구리를 소재로 시조 한 수를 읊으려 했다는 것이다. 시[조]가 무엇인가? 시는 결국 생명작용의 오묘함을 노래하는 것 말고, 시로 제[題]하는 데 앞설 수 있는 것이 무어냐고, 독자에게 묻는 듯했다. 시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요긴한 제재는 바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의 연역演繹임을 에둘러 말씀하는 것으로 들렸다.
절간에서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존엄하게 여기자는 불법의 세계에서 보니 비로소 청개구리 한 마리의 생명작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이 미학적 사유의 대상인 시조 한 수를 짓는 일과 오묘하게 일맥상통하는 경지에 있음을 감탄한 셈이다.
그렇다면 절간을 벗어난 세속의 모습은 어떤가? 어느 나라에서는 왕세손의 결혼식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돈을 뿌렸다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 1달러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극빈에 시달린다. 어느 나라는 영토를 빼앗겼다며[빼앗기지 않겠다며]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우는데, 불국토에서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며 타이른다.
세상 참 모를 일이다. 절간에서 보면 청개구리 한 마리의 생명작용도 신비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기만 한데, 어찌하여 절간 밖에서는 사람마저 청개구리 정도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봉하며 떠받드는 철학의 비조, 소크라테스 선생의 말씀마저도 저들의 안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다.(Living well and beautifully and justly are all one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