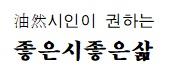

|
세상 보따리 싸들고 산문을 나오는데 이적지 말 한 마디 걸어오지 않던 물소리 하나 따라나온다 문득 그대가 그립고 세월이 이처럼 흐를 것이다
뒤늦게 번져오는 산벚꽃이여 온 산을 밝히려 애쓰지 마오 끝내 못한 말 한 마디 계절의 접경接境을 넘어 이미 녹음처럼 짙어진 것을
-박두규(1966~. 전북 임실) 「산문山門」전문 |
시를 읽는 즐거움을 나는 고요함이 주는 미덕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시를 읽노라면 번잡스럽던 생각이 저절로 맑게 정화되고 진정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어느 시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니 시가 추구하는 진실이 바로 사유의 샘물 긷기임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한다. 결국은 시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고여 있는 생각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작업일 것이라는 나의 판단을 나는 존중한다.
특히 이런 시를 만나면 더욱 그렇다. 산문山門이 반드시 산에 있는 절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찰은 대부분 산천경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소위 명당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리 이름 없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산문’은 세상의 번잡함을 한참 먼 거리에 두고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찰 중에 이름 없는 사찰은 없다. 나름대로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고요를 넘어 적요를 느낄만한 곳이 우리나라 사찰의 특색이다.
철 따라 온갖 자연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문이다. 그런데 그런 곳의 고요함을 더욱 고요하게 하는 것은 산새들의 지저귐이나, 봄 산의 소쩍새 울음소리, 여름으로 치달려가게 하는 머슴새 울음소리, 어쩌다 숲의 가슴을 쪼는 딱따구리 둥지 만드는 소리에 고요함은 훨씬 배가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곳에서 속세의 번거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과 벗하는 즐거움을 세상의 어떤 쾌락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런 고요함을 떨치고 산문을 벗어나는 일은 으레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동행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때의 물소리는 산문의 고요와 속세의 소음이 겹쳐지는 소리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있다. 그러므로 (산문을 나서자 문득) “물소리 하나 따라 나온다”고 했다. [산문의]고요를 떠나 [속세의]소음과 만나러 가는 셈이다.
산문이 경계선이다. 수행자에게 무슨 출세간에 경계선이 있을까 마는, 산문을 나서면서 속세의 온갖 인연들의 실타래도 서서히 실 감기 [혹은] 실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 주지 스님이 산문을 나서며 행자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원 안에 있으면 사흘간 밥을 굶길 것이고, 이 원 밖에 있으면 절에서 내쫓겠다.” 그러면서 절간 마당에 휙~ 동그라미를 그렸다. 절간에 남겨진 행자는 주지스님이 그린 경계선을 넘나들며 궁리했으나 동그라미 안팎을 벗어날 길이 없어 난감했다.
그렇게 물소리를 따라, 혹은 물소리를 앞세우고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헛갈릴 때쯤 세상은 꽃 중심(뒤늦게 번져오는 산벚꽃이여/ 온 산을 밝히려 애쓰지 마오)에서 어느새 녹음 천지(계절의 접경을 넘어/ 이미 녹음처럼 짙어진 것을)로 뒤바뀌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산문의 안이거나 밖이거나, 출세간이거나 속세간이거나, 동그라미 안이거나 밖이거나, 경계를 짓고 따지는 분별심만 없다면, 세상은 온통 녹음 천지인 것을…! 그러므로 “끝내 못한 말 한마디”는 정녕 끝내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판(理判-수행인)의 눈으로 사판(事判-생활인)의 경지를 건너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를 따라왔던 물소리도 제 갈 길을 찾아가고 말 것이다. 계절의 접경을 무너뜨리고 이미 녹음으로 천지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런다. 고요 속에서 고요를 흠향하는 마음으로 소음 속에서도 소음을 흠향할 수만 있다면, 난장판 아수라 속에서도 산문에 들 수 있으며, 고요의 정적 속에서도 난장판에 설 수 있음을 알겠다. 역시 그런다. 산벚꽃이 온 산을 밝히려는 짓을 헛된 탐욕으로 질타할 일은 아니다. 다만 계절의 자지러짐처럼 대책 없이 짙어지는 그리움만은 어쩔 수 없음을, 저 녹음이 지천을 이룬 산문 밖에서 실감하는 즐거움-그것이 있어 시가 있는 것이리라.
그나저나 행자의 신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동그라미 안에 있어]사흘 밥을 굶었을까, 아니면 [동그라미 밖에 있어] 절에서 쫓겨났을까? 하긴 이 화두를 풀지 못하고 동그라미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어리석은 행자를 거둘 주지 스님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쫓겨나기는 마찬가지 신세가 아닐까? 주지 스님이 그린 동그라미를 지워 ‘안팎’ 경계를 없애버리면 그만인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