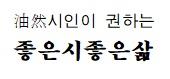

|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틀하니 친한 것은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1912~1945. 평북 정주)「국수」전문 |
이 작품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목에 달아놨으니 눈 밝은 이들은 알아서 찾으라는 뜻일 터이다. 굳이 정답을 말해야 알겠느냐며 시적 화자는 줄기차게 ‘이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묻는다. 정답 ‘국수’는 알겠는데, 그에 따른 낯선 말[시어들]이 거치적거린다는 독자가 많다. 그래서 먼저 낯선 말을 그냥 쓴 시인을 대신해서 토를 달아본다. <댕추가루: 고춧가루, 탄수: 석탄수, 삿방: 삿(갈대로 엮어서 만든 자리)을 깐 방, 아르굴: 아랫목> 등 평안도 방언들이 국수에 더해져 구수한 맛을 내는 양념 노릇을 톡톡히 한다.
절간에서 스님들은 국수를 ‘승소僧笑’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며, 공양으로 국수가 나오면 좋아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절간에서는 육식을 금하니, 만날 나오는 공양이라야 ‘푸른 풀밭[green fields]’ 일색일 것이다.
잡곡밥에 나물 반찬 두어 가지 나오는 공양을 받다가 국수가 나오는 날이면, 그 부드러운 식감에 스님들 입이 저절로 귓가에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수’가 ‘승소’로 바뀐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수행승들의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귀여운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스님들만이 아니다. ‘보릿고개’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필자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다. 여름이면 부족한 식량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사치요, ‘풀대죽’이나마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만날 먹는 것이 ‘깡보리밥’이거나, 이것도 부족하면 덜 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쪄서 먹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국수라도, 그것도 도래상을 펼쳐놓고 둥글게 반죽하여 칼로 썰어서 만드는 ‘칼국수’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여기에 호박이나 감자를 썰어 넣고 끓이는 칼국수는 시골 농촌의 특식이었으니, 이런 국수는 승소가 아니라, ‘농소農笑’라 할 만했다.
이제는 절간에서 국수를 승소라 부른다는 것이 상식화됐지만, 오래전에 ‘승소’를 소재로 졸시를 한 편 쓰기도 했다. 어쩌다가 이 시가 지인들의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다. 나는 생각하기에, 내 작품이 아무리 서툴고, 졸작이라 할지라도 절간에서 수행승들이 국수가 나오면 좋아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 그래서 국수를 ‘승소’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내 착각이었다.
좌중의 어느 한 분이 나에게 되묻는 것이다. “왜 스님들은 국수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며 웃는데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참 난감하였다. 저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풀대죽’이란 이름의 음식은 들어본 적도, 드셔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저런 분이라면 아마도 ‘깡보리밥’이 어떤 깡패들이 즐겨하는 음식이냐고 되묻거나, ‘보릿고개’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고개 이름이냐며 인터넷을 검색하려 들지 않을지, 엉뚱한 짐작이 갔다.
그랬다. 언어 감각도 그렇지만, 그 언어를 육화肉化하는 체험의 농도에 따라 삶을 인식하는 차원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초현실주의 운동을 전개한 시인 앙드레 브르통이 그랬다. “사물이나 문장은 기묘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언어에 의해 분별되는 사물이나 관념들이 사실은 한 덩어리다. 따라서 삶과 죽음,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 표현 가능한 것과 표현 불가능한 것, 숭고한 것과 저속함 등 상호 대립의 인식을 멈추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주관과 객관, 꿈과 현실의 이원성이 제거될 수 있다.”
백석은 그랬다. 평안도 지역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참 많은 감칠맛을 곁들여 ‘국수’ 한 상 잘 차려 내고 있는 것이다. 굳이 잘난 체 으스댈 필요도 없으며, 그저 못난 체 주눅들 필요도 없이, 다만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수에다가, 평안도 사람들의 말맛을 잘 말아서 국수 한 그릇을 차린 것이다.
평안도 사람은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진술을 듣다 보니, 평안도 사람은 [가난 앞에서도] 의젓할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참 살틀하게[살뜰하게: 정성스럽고 빈구석 없게] 지낼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지없이 고담[枯淡하다: 글 그림 등 표현이 메마르고 담담하다] 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간다. 순전히 백석 시인의 이 시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의 국수는 아마도 ‘향소[鄕笑-고향의 웃음]’쯤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그나저나 사람들은 모두가 굶주림 없이, 고대광실에서, 고관대작으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승소’가 무슨 미소인지, ‘농소’가 어떤 웃음인지, ‘향소’가 어디서 나는 웃음소리인지 알 수 없으니, 참 딱하기도 하겠다.
시로 만든 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될 줄을 필자인 나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시정신은 그래서 무소불위한 창작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