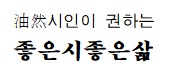

“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
소나기가 지나간 풀밭에 굼벵이가 나왔다, 세상 넓다 기지개 몇 번 켜다 개미에게 들켰다 굼벵이 몸을 트래킹 하는, 개미 개미 개미들
머리가 가렵다 고개를 흔든다 소용없다, 개미는 물러나지 않는다 전후좌우 몸부림친다 햇볕은 쨍쨍, 몸은 지쳤다
개미들이 모여들어 굼벵이를 이끈다 어둠이 좋았을까, 굼벵이는 옛날을 그리워할까?
개미의 축제에 여름이 뜨겁다
-전용창(1951~ 전북 완주) 「굼벵이와 개미」전문 |
우리 언중言衆에게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은 쓰인지가 꽤 오래된, 유효한 말이다. 비록 그 생김새는 볼품없지만 그런 미물에게도 인간은 교훈을 얻기도 한다. 이번에는 굼벵이에 관한 새로운 속담이 생길만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굼벵이가 어느 날 땅속이 갑갑했던지 햇볕세상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그러나 그게 실책이었다. 근면 성실함의 대명사, 벌과 함께 인간의 이기심과 게으름을 맘껏 조롱거리로 삼는 생물이 바로 개미다. 이 개미들이 단백질 덩어리요, 맛있는 먹을거리를 놓칠 리 없다. 몸집으로 보자면 개미는 굼벵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개미는 머릿수로 말한다. 협동심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개미떼들이 일거에 달려들어 무게와 크기에서 몇 배나 크고 무거운 굼벵이를 개미굴로 끌고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럴 때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이와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치타는 시속 100km로 가젤을 추격한다. 팽팽하게 조율된 근육질을 뽐내며 치타가 사냥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젤 역시 잡히면 끝이다. 용수철처럼 통통 튀어 오르며 달아나느라 안간힘을 쓴다. 연약한 듯 보이는 가녀린 가젤이 치타의 추격권에서 벗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 가젤을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치타에게는 굶주린 새끼들이 어미의 사냥감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어미치타가 사냥에 실패한다면 새끼치타 역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필자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이제 어부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듯 격분하여/ 짐승을 두들겨 패며,[디베히* 말로]/ 죽어가는 참치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나구발라, 나구발라,/ 헤이 아루발라난/[이년아, 이년아, 넌 이제 죽었다]// 그가 여드레 만에 처음 잡은/ 참치였다. 집에서는/ 아이 여섯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졸시「연가 11」전문)> 디베히어는 인도양 중북부 섬나라 몰디브 공화국의 공용어다. 알랭드 보통의 책『일의 기쁨과 슬픔』에 나온 에피소드를 시의 형식으로 꾸며본 것이다. 집에서는 여섯이나 되는 어린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다. 여드레 만에 잡힌 참치에게 몽둥이질을 해대면서 내뱉는 말에는 어부의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 있다.
이럴 때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럴 때마다 창조주[하느님, 하나님, 신, 조물주, 여호와, 알라, 천제, 산신령…]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까? 아니면 조물주는 스포츠 경기라도 관람하듯이 서로 다투며 벌이는 생존 경쟁의 치열함을 구경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할 것일까? 도무지 헤아릴 길이 막연하다.
유신론자들은 이럴 때 이 모든 게 창조주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며,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일까? 무신론자들은 매우 편리한 방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지하여, 삼라만상은 저마다 생존에 합당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며, 오불관언[吾不關焉-나는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만일까?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이다. 삼라만상은 저마다의 상도[常道-자연적 질서이자 섭리]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대립한들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건, 이것을 밝혀내는 데는 과학자보다는 철학자나 시인에게 맡겨야 한다.”(E.윌슨)고 했다.
이 시「굼벵이와 개미」처럼 보여주면 그만이다. 누구의 편을 들건 나머지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무엇이 진리이건, 유신론과 무신론 중 무엇이 진실이건, 과학과 철학을 융합한 경지에서 보여주는 이 실체적이고 체험적인 진실 앞에서 선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문학은 다만 세계를 사유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뿐이다. 그 단서를 통해서 삼라만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複雜性]에도 자연이 그렇듯이, 세계와 인간도 복잡다단함 속에 자연의 상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미학적으로 공감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