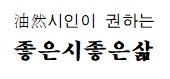

“선연善緣도 악연惡緣도 상생하는 필연必然이다”
|
온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약속 있다는 것은 없다는 증거—
시작 또한 끝을 향한 약속 아니겠는지 [멀면 얼마나 멀겠는가!]
기울어진 경주장은 늘 분주히 쏟아낼 뿐 질서는 속성, 자연은 그 품이다
독백을 삼키고, 쏟아낸 단어들을 바람이 안고 달려간다
끝내 열리지 않는 열쇠는 녹슬고 엉킨 실타래엔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다
오늘도 붉게 타는 저녁 햇살 아래 지평선이 길게 가로 눕는다
-장지나(1946~ 전북 완주)「필연」전문 |
시가 이렇게도 유효한 어법을 지닌 언어의 그릇임을 이 작품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재확인한다. 우주에 편재해 있는 섭리를, 이를 정통으로 풀어낸 노자의 사상을, 시법은 매우 간결한 일상을 들어서 형상화한다.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일상 되풀이되는 삶의 실상들로 대입함으로서 철학이 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중핵이며, 사상이 나와 상관없는 고담준론[高談峻論-뜻이 높고 바르며 매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의 뿌리임을 보여준다.
노자의『도덕경』풀이 중에서 필자의 지적 탐구심에 가장 매력적으로 호감을 주는 책(최진석『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에 의하면, 노자 사상의 핵심은 바로 유무상생有無相生의 도道에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준다는 뜻이다. 유는 무를 살려주고, 무는 유를 살려준다는 뜻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가 유인 이유는 유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무 때문에 즉 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유가 되고, 똑같이 무도 무 자체 때문에 무인 것이 아니라 유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무가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유무상생’하는 이치로 보자면, 어려움[難]과 쉬움[易]도, 긺[長]과 짧음[短]도 상생한다. 높음[高]와 낮음[下]도, 자연의 소리[音響]과 사람의 말소리[音聲]도, 앞[前]과 뒤[後]도 서로 상생하면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 있을 뿐이다. 어려움이 없으면 쉬움도 없다. 긴 것과 짧은 것이 대비되지 않으면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있을 수 없다. 높낮이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자연의 소리[음향]도 높낮이가 있는 분절의 형태로 음가가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음성]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성은 서로를 살게 해준다.
이처럼 상반되는 듯이 여겨지는 것들이 한 짝을 이루면서 꼬여 맞물려 돌아가는 이치를 도라 하였다. 그 원동력이 자연의 섭리다. 상반되어 반대편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도의 운동력[反者道之動]이며,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하는 모습[弱者道之用]이다. 이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만 자연이 본래 갖추고 있는 상도[常道-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시적 정서도 상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온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있다’는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노자의 사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적 정서는 그 두 관계 쌍 사이에 ‘필연必然’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자는 자연의 질서, 상반되는 운동력과 유약한 듯이 작용하는 자연의 도를 드러내려 했다면, 시적 화자는 인연의 운동력이 필연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그려내고자 한다. 그것도 몸과 맘을 지닌 채 갈등하고 번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상성을 통해서 그려내고자 한다.
이어지는 ‘시작’과 ‘끝’의 정서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인연은 시작이 있음으로 비롯하지만, 또한 끝이 있어 인연의 단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시적 화자는 자연의 상도를 삶의 일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쉽게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없는 질긴 필연의 숙명 앞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
고뇌하는 자아는 ‘독백을 삼킨 단어들’이 ‘바람을 안고’ 달려가는 모습이거나, ‘녹슨 열쇠’로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어 안타까워한다. 쉽게 끊을 수 있다면 인연도 아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선연이든 악연이든 필연적 관계는 우리 삶을 끓어오르게 한다. 시방세계[十方世界-온 세계]는 인연 속에서 타오를 뿐이다. 그 중심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사랑도 미움도, 좋아함도 싫어함도, 이기심도 이타심도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필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시적 자아는 필연의 다리를 건너 평화의 세계로 안주할 수 있는 상도를 발견한다. “오늘도 붉게 타는 저녁 햇살 아래/ 지평선이 길게 가로눕는다” 사람됨의 필연 속에서 몸부림칠지라도, 엉킨 실타래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뜨거울지라도, 결국 자연의 상도를 찾아내고 만다. 모든 번뇌는 지평선에 가로눕는 햇살처럼, 유무 상생, 자연의 힘[道]을 깨닫는 순간 좋은 관계[善緣]도 싫은 관계[惡緣]도 필연적 관계로 나를 순응케 한다.


